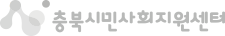| [하릴없이 읽는다] 무의미가 삶을 조여올 때 - 폴 칼라니티, 『숨결이 바람 될 때』(2016)를 읽고 |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22 |
| 첨부 | 조회 | 3837 | |
무의미가 삶을 조여올 때 - 폴 칼라니티, 『숨결이 바람 될 때』(2016)를 읽고
*서지 사항 폴 칼라니티(Paul Kalanithi), 『숨결이 바람 될 때』 (원제: When Breath Becomes Air) /김동우(충북NGO센터 간사) 크고 작은 아픔에도 인간은 쉽게 육신의 한계, 삶의 유한성 같은 사변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 끝엔 언제나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도 새삼스럽게 발견한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죽는다’는 명징한 사실을 모르지 않았지만, 몸으로 체감하는 죽음의 무게는 한 인간이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새롭게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무게가 비유가 아닌 실재하는 위협이라면 그 이후 삶의 궤적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숨결이 바람 될 때』는 전도유망한 젊은 의사가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자신의 남은 삶에 찾아온 허무와 절망을 상대로 벌인 투쟁에 관한 기록이다.
저자이자 화자인 폴 칼라니티는 장래가 촉망받는 신경외과 의사다. 끊임없이 의학과 환자에 대해 연구하는 태도, 수술 실력 등 의사가 갖춰야 하는 역량을 인정받으며 여러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받기도 한다. 그의 곁엔 사랑하는 아내도 있다. 영문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문학과 인간, 삶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도 지녔다. 많은 것을 이뤄왔고, 더 많은 것이 이뤄질 것만 같았던 어느 날 그에게 불행이 찾아온다. 서른다섯 살이 되는 해 레지던트 생활 수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폐암 말기 진단을 받는다. 몸과 의식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며 환자에게 삶을 불어넣던 자신이 누군가의 환자가 된 것이다. 그에게 도래할 것만 같았던 밝은 미래, 의욕적인 삶 모두 흔들리기 시작한다.
암 진단을 받고 쉽게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그가 보이는 태도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삶에 대한 강한 의지다. 단순히 생을 연명하기 위해 분주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년을 죽음과 함께 보낸 후 나는 편안한 죽음이 반드시 최고의 죽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략) 우리는 죽어가는 대신 계속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p.174) 그는 의사로서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자신이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가치들을 잊지 않으며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점검한다. 심지어 자녀 계획도 세운다. 물론 그 태도와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은 장애물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그에게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삶에 대한 어떤 의지와 전망을 세우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어쩌면 이것이 죽음이 아직 살아있는 인간에게 가하는 가장 큰 형벌인지도 모른다. 더 이상 삶이 가치가 없고,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느낄 때 인간은 깊은 절망과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지지 않는가.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쉽게 주저앉지 않는다. 무기력하게 죽음을 준비하기보다 남은 삶을 살아내기로 한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회 방문객과도 같지만, 설사 내가 죽어가고 있더라도 실제로 죽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살아 있다” (p. 180)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수술실로 돌아간다. 그것이 단순히 남은 레지던트 기간을 채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원하는 대학교수로 부임하기 위한 의지일까. 아마 그도 설령 그러한 성취를 하더라도, 자신의 몸에 남은 시간이 그 이후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점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단지 죽음을 준비하기보다, 끝까지 살고자 했을 뿐이다.
불가능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도 그것을 시도하는 일은 인간과 삶에 대한 그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또한 생물학적인 유기체이기도 하다. 뇌 역시 하나의 생체 기관인 만큼 물리학 법칙의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하다. 문학은 인간의 의미를 다채로운 이야기로 전하며, 뇌는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기관이다” (p.51) 그는 인간과 삶을 관념적으로만 인식하지도(문학) 물질로만 인식하지도(의학) 않는다. 이러한 총체적인 인식이 그가 드리운 죽음 앞에서 쉽게 허무에 빠지거나, 문학이나 사변으로의 도피를 택하지 않은 요인일 것이다.
죽음에 대한 직시는 허무나 무의미를 강하게 밀어내고, 그것이 설령 이뤄질 수 없는 몸짓일지라도, 삶의 본질과 중요한 가치를 향하도록 인간을 독려한다. 그런 점에서 저자가 되뇌인 베케트의 구절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없어, 그래도 계속 나아갈 거야(I can’t go on. I’ll go on).”(p.180)은 곱씹어 볼 만하다. 그럼에도 삶을 추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삶을, 인간다운 삶을 구성하는가, 삶과 죽음은 어떻게 다른가. 아마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궁리하는 과정에서 이 책은 ‘생각 많고, 야심만만했던 어느 미국 남성 의사의 파란만장했지만 짧았던 생에 대한 회고’ 이상의 의미를 획득할 것이다.
|
|||
| 이전글 | [청도협 책잔치] 이안 시인 강연 | ||
| 다음글 | 충북NGO센터는 지금 축제 준비 중 | ||